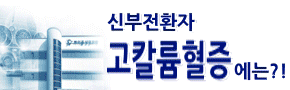[데스크 시선] 찜찜한 의약품 공동개발 규제
- 천승현
- 2021-05-11 06:13:09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의약품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건의 생동성시험이나 임상시험 자료로 허가받을 수 있는 의약품을 4개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이다. 바이오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동성시험은 제네릭 개발을 위한 일종의 임상시험이다. 사실상 제약사들의 의약품 개발을 위한 공동임상을 제한하는 규제인 셈이다.
사실 의약품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제약사 수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들다. 제약사들간 협력을 통해 의약품 개발 전략을 공유하는 것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으로 규정해 직접적으로 개입할 영역은 아니라는 의미다.
생동성시험의 규제가 적용되면 같은 제조소에서 생산된 똑같은 의약품도 별도로 임상시험을 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생동 규제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10년 10월 규개위 회의에서는 “비과학적이고 논리적 이유가 없는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라며 생동제한을 이상한 제도라고 단정지었다. 정부가 다시 공동생동 규제를 추진하자 지난해 규개위는 “제약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것 역시 의약품 품질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효과가 낮고 연구개발 증진 효과도 미미하다”라며 반대했다.
개량신약 공동개발 규제 역시 제약사들의 연구개발(R&D) 전략에 정부가 개입하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에는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임상비용을 분담하면서 개량신약을 공동개발하는 방식이 많았다. 개발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면서 개발 실패나 상업화 이후 매출 부진에 따른 리스크를 공유하자는 취지다.
제약사들의 자발적인 R&D 협력을 정부가 제약한다는 눈초리가 나오는 이유다. 제약사들의 R&D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중소제약사는 개량신약의 개발을 포기하고 제네릭 개발에만 집중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형·중소제약사 간의 개발 양극화 심화에 대한 대책을 묻자 김진석 식약처 차장은 “복지부와 R&D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의약품 공동개발 업체 수 제한’이 과학이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찜찜한 제도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절실할 정도로 국내 의약품 시장이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 더욱 찜찜한 현실이다.
이미 대형 제네릭 시장에는 대부분 100개 이상의 제약사가 진입하며 출혈경쟁을 펼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아토르바스타틴 제네릭을 등재한 제약사는 총 139곳으로 집계됐다. 2015년 99곳보다 40곳 늘었다. 2018년 118곳에서 2019년 133곳, 2020년 139곳으로 최근 들어 더욱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5년 클로피도그렐 시장에 제네릭을 내놓은 국내제약사는 91곳이었는데, 5년 뒤에는 133곳으로 42곳 늘었다. 2018년 아토르바스타틴 제네릭을 내놓은 제약사는 112곳이었는데 2년만에 21곳이 추가로 가세했다. 도네페질 시장에 진출한 제네릭 업체는 2018년 89곳에서 2년 만에 134곳으로 치솟았다.
제네릭의 가치도 점차 떨어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값싼 제네릭이 시장을 평정하는 현상이 일반적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오리지널의 점유율은 끄떡없는 반면 100개 이상의 제네릭이 한정된 시장을 나눠가지면서 평균 매출도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하향평준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2015년 아토르바스타틴 제네릭 업체 1곳의 처방액은 31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에는 27억원으로 5년새 12.8% 감소했다. 클로피도그렐 성분 제네릭의 전체 처방액은 2015년 1687억원에서 2000년 2351억원으로 39.4% 늘었다. 그러나 제네릭 업체 1곳당 처방액은 19억원에서 4.6% 축소됐다.
개량신약 시장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개량신약 공동개발이 쌍둥이 제품 무한 복제로 후발주자들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는 도구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부쩍 많이 엿보인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제네릭 새 약가제도에는 급여등재 시기가 늦을 수록 상한가가 낮아지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담겼다.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게 된다. 특정 제약사가 임상시험을 통해 개량신약을 개발하고, 위임제네릭을 20개 이상 모집하면 후속으로 진입하는 제네릭의 약가는 크게 떨어지는 구조다.
실제로 상당수 제약사들이 개량신약 임상자료 공유를 통해 후발 제네릭의 진입 동기를 떨어뜨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개량신약 임상자료 공유 업체도 제한하는 이상한 제도 도입의 기폭제가 됐다.
물론 제약사들의 의약품 무한 복제는 정부의 제도 허점으로 발생한 측면이 크다. 정부의 규제 변화 움직임에 따라 제약사들은 제네릭 장착에 열을 올렸다.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 이후 정부의 제네릭 규제 강화를 예고하자 제약사들의 제네릭 허가는 봇물을 이뤘다.
약가제도가 개편되자 높은 약가 선점을 위해 위임제네릭이라는 탈을 쓰고 개량신약 무한복제라는 새로운 유행도 등장했고, 과거 속으로 사라졌던 ‘약가 알박기’ 부작용도 다시 등장할 조짐이다.
그럼에도 최근의 유례없는 의약품 난립은 누구도 납득하기 힘든 현상이다. 제약사 규모에 상관없이 대다수 업체들이 동일한 시장에 뛰어든만큼 중소제약사를 제네릭 난립 주범이라고 몰아가기도 힘들다.
제네릭 난립과 같은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꺼내들 때마다 시장에서는 역효과가 나기 일쑤였다. 해외에서는 값싼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을 장려하는데, 언제부턴가 국내에선 제네릭이 찬밥 신세가 됐다. 과연 어디부터 잘못된건지, 정부와 제약사들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성찰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2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불응성 소세포폐암 신약 '임델트라, 급여 문턱 다시 넘을까
- 9[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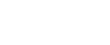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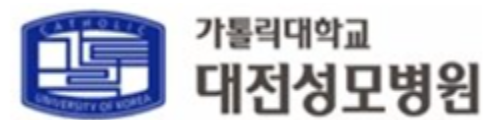












![[리쥬올]리쥬올 PDRN 약국 1위 PDRN](https://cdn.platpharm.co.kr/2025/09/2509260220180000170.webp)
![[유한양행] 콘택콜드 걸렸구나 생각되면](https://cdn.platpharm.co.kr/2025/10/2510282252420008436.webp)
![[SK케미칼] 속편한정 복합소화제](https://cdn.platpharm.co.kr/2025/12/2512040916400005920.webp)
![[리쥬올]레티노 멜라세럼 저자극 레티놀](https://cdn.platpharm.co.kr/2025/09/2509260219360000145.webp)
![[신신] 아렉스 두번효과로 강력한](https://cdn.platpharm.co.kr/2025/10/2510230254510000664.webp)
![[셀로맥스] 베베락스 온가족 안심 관장약](https://cdn.platpharm.co.kr/2025/09/2509171131320018843.webp)
![[신신] 새사래 상처연고 습윤밴드](https://cdn.platpharm.co.kr/2025/10/2510210339570001784.webp)
![[종근당] 벤포벨에스 어른들의 피로회복제](https://cdn.platpharm.co.kr/2025/07/2507290841210004645.webp)
![[유한양행] 미녹펜겔 탈모스팟 집중케어](https://cdn.platpharm.co.kr/2025/09/2509220824180004563.webp)
![[더본메디칼] ATC인쇄리본 특가](https://cdn.platpharm.co.kr/2025/04/2504100527360001454.jpg)
![[SK케미칼] 트라스트패취 피록시캄 성분](https://cdn.platpharm.co.kr/2025/10/2510020656150002375.webp)
![[오펠라] 부드럽고 편안한, 둘코락스에스장용정 20정](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11/1762260404625.png)
![[켄뷰] 오리지널 폼타입, 로게인5%폼에어로졸60g](https://i.baropharm.com/products/dc84d96e-d0b4-46bc-bcc8-d62016406fe4.png)
![[아워팜] CJ웰케어, 바이오코어 1000억 유산균](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12/1765955416559.png)
![[레비온] PDRN+EGF, 레비온RX PDRN EGF 크림](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12/1765949426601.png)
![[아워팜] 에너지 바로 충전, 바로콤](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12/1764922282624.png)
![[아워팜] 건강한 힘, 바로바이오틱스 kids 비피더스 50억](https://i.baropharm.com/products/202602/1770888420842.png)
![[한독] 붙이는 통증 전문가, 케토톱 액티브 플라스타(쿨) 40매](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03/1741829602305.png)
![[휴온스 ] 비듬을 한번에, 니조랄 2%액](https://i.baropharm.com/products/478a284d-4361-4b4a-8a00-8bab80f34319.png?label=PLAN_01)
![[레킷코리아] 목 아플 때, 스트렙실 허니&레몬 트로키 12정](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02/1739520767049.png?label=PLAN_01)
![[켄뷰] 다양한 통증에, 타이레놀정 500mg 10정](https://i.baropharm.com/products/6c6ea4f4-7ab2-44f2-a165-f062d80f525b.png)
![[아워팜] 우리아이 맞춤설계, 바로타민 kids 엘더베리맛](https://i.baropharm.com/partner/products/3f39593e-6318-4dd9-a778-c008c868b5c8.png)
![[아워팜] 아이들이 먼저찾는, 바로타민 kids 미네랄](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12/1766121243228.png)